[프라임경제] 겉보기엔 안정돼 보이는 은행권의 부실채권. 속을 들여다보면 곪아간다. 수치만 보면 괜찮아 보인다. 그런데 중소기업 신규 부실은 5년 만에 최고치다. 배드뱅크가 해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잔액은 16조6000억원, 비율은 0.59%로 전분기와 같았다. 수치만 보면 위기 조짐은 없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 6조4000억원 가운데 4조4000억원이 중소기업에서 나왔다. 대기업 신규 부실이 4000억원으로 줄어든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침체, 원자재·인건비 부담 등이 겹쳐 은행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특히 건설·도소매·자영업 등 취약 업종에서의 위험은 더 쌓이고 있다.
문제는 단순 매입만으로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일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속도와 강도가 부족하다. 살아날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자금 재조정과 체질 개선을 병행해야 하고, 도산 기업은 신속히 정리돼야 한다.
이에 정부와 은행권은 부실채권을 한데 모아 정리하는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은행이 1000억원 안팎을 출자해 별도의 기구 신설, 개별 은행이 안고 있던 부실채권을 매입·정리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통해 은행의 부실자산을 대규모로 매입, 자본을 투입해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았다. 유럽에서는 스웨덴의 '세큐룸(Securum)'처럼 국가가 부실채권을 인수해 별도 법인에서 정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 모델을 활용, 금융위기 이후 여러 국가들이 이 방식을 도입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단순 매입이 아닌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을 병행해 효과를 거뒀다는 점이다. 우리도 이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행에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지금보다 훨씬 과감한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은행별 출자 부담은 수백억~1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단순히 비용 분담에 그칠 경우 주주환원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용 분담이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맞물릴 경우 은행권 리스크 관리와 자본여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본다.
금융당국도 같은 맥락에서 은행권에 대손충당금 확충을 야기하고 있다. 부실채권을 외부 기구로 떠넘기기보다 은행 스스로 손실흡수 능력을 키우라는 의미에서다.
따라서 배드뱅크가 단기적 완충장치일 수는 있어도 충당금 확충과 구조조정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 충당금 확충은 속도를 내고 있으나, 구조조정은 여전히 부족하다. 배드뱅크가 진짜 해법이 되려면 구조조정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부실은 단순한 경기순환 탓이 아니다. 산업 구조의 취약성과 금융 접근성 불균형이 얽힌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다.
배드뱅크가 진짜 해법이 되려면 단순한 채권 매입 창구가 아닌 구조조정과 회생 전략을 함께 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도 '또 다른 미봉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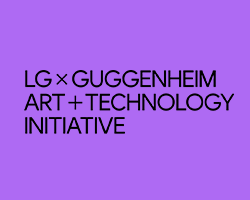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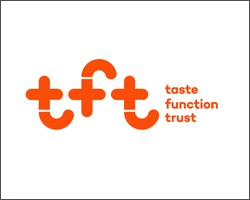















![[포토] 유안그룹](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716774_1766021723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