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글쎄요. 아마 그런 행정지도가 있기는 했을 텐데…."
예전에 금융 보안절차 강화와 관련한 취재를 한 적이 있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일부러 번거로운 일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당국의 행정지도가 있지 않았는지에 주목했다.
행정지도를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곳, 또 이런 문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각 개별사나 연합회 등에 모두 문의를 했다. 뭔가 전반적인 '정황'까지는 나왔다. 하지만 실체가 잡히는 게 없었다. 이미 대통령이 한 번 바뀌었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데다, 당국에서도 내부 조직체계가 바뀌거나 해서 이런 지난 일에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했다.
사실 기자에게 알려줘서 좋을 게 없다, 굳이 오래 전 일을 들추기 귀찮다는 생각도 작용을 하긴 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무도 못 찾는다"는 게 더 큰 것 같았다.
기사를 쓰다 막혀서 답답한 것보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자야 그냥 기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취재능력 부재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하지만 아마 훗날에 어떤 금융사 연구자가 이런 주제를 놓고 기록을 뒤진다면, 돈도 많이 들고 번거로운 제도 개편을 '그냥' 혹은 '어느날 갑자기' 은행 관계자들이 모여서 결정했다는 결론(?)을 내기 쉬울 것이다. 이것은 옳은 것인가?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조언·요청·권장·주의·경고·통고 등의 방식으로 어떤 행정목적 달성을 추진하는 것을 행정지도라고 부른다. 하지만 '사실적 행위'라는 특성상, 그런 지도를 한 쪽에서도 받은 쪽에서도 확실히 언급하기를 꺼린다. 공문이 발송되는 등 구색을 갖춰도 이런 속사정 때문에 시간이 좀 흐르면 '그런 일이 있기는 한데(있었을 텐데) 실체는 찾을 길 없는' 상황으로 빠지기 쉽다는 함정이 있다. 시간이 지나고 담당이 바뀌고 조직이 이리저리 개편되면 '그걸로 끝'인 것이다.
가끔 제대로 된 지하지도 한 장 없이 수십년간 각종 가스며 전기, 통신의 파이프와 라인이 이리저리 땅 속에 어지럽게 가설돼 있어서 큰 문제라는 소리를 듣는다. 제대로 된 기록없이 애용되어 온 행정지도가 바로 저 지도 없는 지하 세상처럼 우리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보면 좀 지나친 것일까?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상호저축은행 관련 해설서를 내면서 다양한 건전성 분류 착오 사례 등은 물론 행정지도 내용까지 담기로 했다고 한다는 점은 그런 불편한 관행과 달리 기록을 떳떳하게 널리 공개하겠다는 점에서 이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월 '정보공개 확대 방안'에 따라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행정지도 41종류의 목록 및 내용도 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는데, 이번 해설서 편집 방향을 보면 그 이후로 실제로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는 것 같다.
 |
||
금감원의 최근 변화 노력은 그간 누군가는 시도했어야 했지만 번거롭다며 아무도 해 오지 않았던,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 이런 번거로운 노력이 다른 행정기관, 감독기구로도 퍼지길 바란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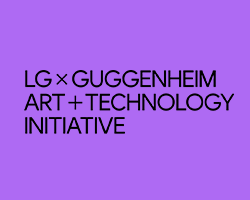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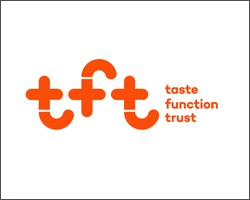



















![[포토] 유안그룹](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716774_1766021723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