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하청과 협력이 완전히 바톤 터치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듯 하다. 특히나 유리하거나 홍보를 할 때(보도자료를 뿌릴 때)에는 협력업체라는 표현이 애용되다가도, 어느 순간 하청, 재하청 등 오래 써온 관습적 표현이 대기업 관계자의 입에서 다시 튀어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나 이렇게 대기업이 책상 서랍 한켠에 밀어넣어 다시는 찾지 않을 것 같던 하청, 혹은 재하청이라는 표현을 '전가의 보도'처럼 다시 꺼내드는 경우는 묵은 언어습관에 의해 무작위로 돌발 등장하는 것 같지 않다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협력업체라는 표현을 평소 즐겨 쓰던 이들도 다시 하청, 재하청 등 오래 전 용어를 되살려 낼 때는 '뭔가 불리할 때' 혹은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을) 때'인 경우가 많다.
최근 에스원은 대학 경비대행 업무와 관련,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건국대 직원과 경비업체 직원 간에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이에 대한 지적이 오갔다고 한다. 이로 인해 감정의 앙금이 쌓인 강 모 씨는 대학 직원 유 모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고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은 경비업체에 의해 오히려 대학 캠퍼스의 평화가 깨진 것이다. 학기말시험 기간 막바지에 면학 분위기로 충만한 캠퍼스에서 터진 이 돌발 상황을 놓고 학생들은 안전이 송두리째 흔들린 듯 뒤숭숭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경비용역 업계 1위 에스원이 보인 태도를 보면 실망스러운 감이 없지 않다. 에스원 관계자는 이 사건을 저지른 강 모 씨를 "하청업체 직원"으로 규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본사 관계자들에게 이번에 유혈 참사를 일으킨 강 모 씨와 같은 직원들은 '하도급 용역 업체'로만 보였던 모양이다.
에스원 관계자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이 사건에 대해 취재하는 본지 기자들에 대해 "재하청을 준 경우이기 때문에 하청업체를 관리 감독을 못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이 자체야 얼마나 훌륭하고도 깔끔한 표현이랴. 하지만 이어진 "(재하청 직원들은) 저 사진 속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지 않는다",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점이 간과되어 있다" 등을 특히 강조하는 답변과 해명을 보태어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다. 결국 방점은 '책임감'보다는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데 찍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비약일까. 시선을 에스원 본사로부터 최대한 유리시키는 치밀한 '관리 능력'을 선보였다고 하면 또 지나친 확대해석일 것인가. 업계 1등업체나 1등 그룹 계열사답지 않은 태도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별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 싶다.
이렇게 어떤 '문제'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항상 우리 직원과 하청, 재하청, 용역, 아르바이트생, 외부계약 등 다양한 그 외의 인물들을 가르려 들고 '다름'을 '강조'하는 게 상례다. 하기는 에스원이나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그게 아무리 통상적인 모습이라 해도, 어떤 불리한 기사가 나간 후 이렇게 "그 직원은 '우리 직원'이 아니고요, *****인데요"라고 '강조'를 하려드는 해명 전화를 받노라면 답답한 마음이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홍보 관계자로서는 그나마 이거라도 찾아냈다는 안도감에 의기양양한 태도로 항의 전화를 하는 모양이나, 이런 류의 해명은 썩 유쾌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게 중론인 것으로 안다.
 |
||
이런 경우에 우리 사람이, 혹은 우리 직원이라고 물의 상황에 대한 송구스러움부터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궁금하다. 어차피 고객은 하청이 아닌 애초 계약을 따간 대기업을 믿고 거래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하청 주고 무책임한 대기업이라는 또다른 인식을 보탤 수도 있다.
임혜현 기자 /프라임경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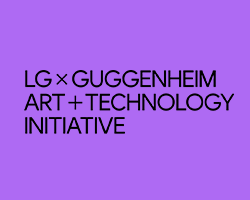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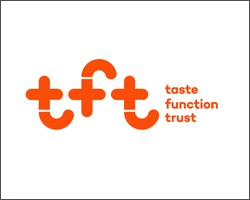











![[포토]](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716010_1765500157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