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에 W 은행 대(對)언론 부서에는 J 부부장이라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중년이던 그 분은 우선 어느 매체에나 친절했을 뿐더러, 행여 W 은행에 불리한 기사가 나갔다고 해서 기자들에게 그닥 싫은 소리를 하는 법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더욱이 기자들에게 자료를 안 주거나, 숨기거나, 자료를 주더라도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게끔 함정을 한 두 개씩 파놓고 주는 일이 더러 있는 다른 은행들의 홍보직원들과는 달리 정직하기 이를 데 없는 분이었다.
기자가 W 은행에 출입하고도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인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본사로 항의를 들어온 고객들이 있어 본사와 붙어 있는 본점영업부쪽이 제법 시끄러웠다. 마침 갖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한 장 찍은 다음 홍보실에 올라간 기자는 J 부부장에게 어떤 사정인지를 여쭤봤다. 당연히 제대로 된 답은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W은행 ***사건 쉬쉬하며 덮기에만 급급' 정도로 리드문까지 대강 잡고 있었다.
하지만 J 부부장은 그날따라 더 느릿느릿한 말투로 "뭐 다 알고 왔겠지만…"이라고 운을 뗀 다음, 이러저러한 사건 내용으로 항의를 온 고객들이며, 이미 법원에 접수된 바여서 일단은 관망할 따름이라고 선선히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해 주는 게 아닌가.
"어쨌든 고객들이 손실을 본 건 사실이니까요"
외려 흔히 생각하듯, 홍보맨이니 은행 입장부터 앞세우기가 마련이고, 뭔가 한 자락을 깔고 시작하려니 각오를 하고 듣게 마련인데, 이렇게 나오니 되려 맥이 빠지고 '그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들른 기자들도 대부분 정직한 설명에 어쩐지 맥이 빠져, 단신처리를 하거나 그나마 쓰지도 않았거나(더러는 보고내용이 이렇게 올라오자 '재미없다'는 데스크 판단으로 걸러지기도 했을 터이다) 했는지, 그날의 소동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시간이 좀 흘러, 기획재정부의 수장을 맡던 분은 한 동안 외환 방어에 신경을 쓴다는 평가를 듣더니 외환보유고를 꽤 까먹었다는 소식이 나돌던 무렵, 이번엔 "난 공개적으로 환율 방어 정책을 한 적이 없다"고 일갈,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이런 그에게 어느 교수는 시사주간지 투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그런 말은 한 적은 없지만, 그가 편 정책들을 훑어보면 환율 방어, 수출 주도 고성장을 염두에 뒀음이 분명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회가 시끄럽다. 미디어법이라고 불리는 언론관계법 정비 문제로 방송사 직원들은 파업에 돌입했고, 일각에서는 언론 장악 음모를 이명박 정부가 공공연히 드러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 와중에 어느 상임위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에게 "우황청심원을 안 가져 왔다"면서 회의를 연기하고 싶다는 듯한 페인트 모션을 썼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이런 제스처에 야당 의원들의 긴장이 좀 풀어진 이후,
 |
||
물론 정책을 펴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행보를 덮어야 할 때도 있고, 적들과 대치하는 국면에서는 술책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높으신 분들의 어쩐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접할 때면, 머리로는 어쩔 수 없지 그들을 이해하면서도, 어쩐지 '홍보실 직원 같지 않게' 정직했던 W 은행 J 부부장이 떠오르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임혜현 기자/프라임경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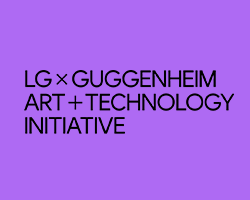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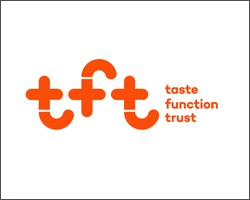











![[포토]](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716010_1765500157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