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04년 당시 진념 경제부총리가 “나중에는 우리가 중국 사람들 마사지를 해 주며 살지 모른다”고 어느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표현상 지나친 감이 있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지만, 그 불과 몇 년 후 중국이 ‘G2’ 중 한 당사자로 부상하면서 그 발언은 기우가 아닌 현실화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오죽한 기자수첩을 고위관료의 예언에 비하겠는가마는, 기자는 최근 스리랑카에 대해 그런 기분을 느낀 바 있다.
과거 실론(Cyelon)으로도 불렸던 스리랑카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타밀 반군과의 치열한 내전, 차(茶) 같은 플랜테이션 농업에 경제를 의존하는 나라쯤으로 여전히 각인돼 있다.
그런 스리랑카가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배경으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세계 경제 위기 여파 속에서도 작년 한해 6.7%의 높은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이번에는 한-스리랑카 무역투자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기업인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직접 현지 경제인들이 대거 서울을 찾았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스리랑카 고위 공직자들의 행보는 여러 모로 눈에 띄었다. 비단,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대사와 상무관 몇 현지직원들이 지원을 나온 외에도 외교부 차관과 투자청 관계자가 자국 경제인들을 이끌고 방한했다고 해서가 아니다.
스리랑카의 니오말 페레라 외교부 차관과 시반 데 실바 투자청 국장이 강조한 것은 인도와의 FTA(자유무역협정)를 배경으로 한 투자 교두보로서의 매력. 싼 인건비, 수출자유구역 등을 위시한 세제 특혜, 한국어 구사 인력이 많다는 점이나 천혜의 자연 환경 등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자칫 평범한 소국의 투자유치전으로 보였을 법 하다.
하지만 자국 경제가 인도 경제 구심력에 휩쓸려 갈 수도 있었을 FTA에서 무사히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이 국가가 현재 위치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구사할 수 있는 선견지명을 갖추고 노력 중이라는 인상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아울러 고위 외교관인 차관이 기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 중에 체면 불구하고 “투자하는 국가마다 수출자유구역을 설치해 주고 싶다”고 언급하는 등 이 나라 공직자들이 직무의 벽이나 직급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많은 고민을 해 오고 있고 이를 충분히 밖으로 드러낼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몸소 외자투자유치 현장에까지 따라나서는 부지런한 고위 공직자도 예사롭지 않은데, 그러면서도 꿀리지 않고 “한국보다 우리 시장이 크다. 우리 뒤에는 (단일 경제권인 인도 등을 포함) 16억 시장이 있다”고 설명하는 스케일의 공직자들이 있는 나라라면? 스리랑카가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
||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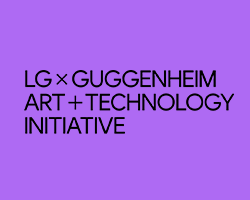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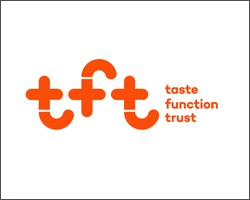



















![[포토] 유안그룹](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716774_1766021723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