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불황 생존기①] 주택 사이클 흔들리자 "에너지로의 전환" 관건은 통제력
원전·SMR·재생·수소…불황기에도 발주가 이어지는 新현금창구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6.01.23 12:37:35

현대건설-웨스팅하우스가 공동으로 글로벌 확대 추진 중인 대형원전 AP1000® 조감도. Ⓒ 현대건설
[프라임경제] 주택 경기 변동성과 PF 조정이 장기화하면서 건설사들의 위기 대응은 분명해지고 있다. 분양 회복을 기다리는 전략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주택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전환·AI 인프라 등 발주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동시키고 있다. 불황기에도 매출과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해 건설사들이 실제로 추진하는 '대체 매출' 방향성과 함께 그 과정에서 성패를 가르는 통제력(원가·공정·계약) 및 반복 수익 모델(O&M·자산화)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 건설사들이 주택 중심 단기 사이클에서 벗어나 발주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시장을 '대체 매출원'으로 키우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분양 시점과 시장 분위기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좌우되는 주택 시장과 달리 에너지 인프라는 불황 국면에서도 국가 정책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투자가 이어지는 분야로 평가된다. 주택을 대신할 수 있는 실물 시장이라는 점에서 건설사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범위 역시 빠르게 확장되는 분위기다.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이하 SMR), 재생에너지 EPC를 넘어 수소·암모니아 밸류체인, 송전·변전 등 전력망 인프라까지 포괄하는 구조다. 발전–이동–소비로 이어지는 전력 체계 전반이 하나의 수주 시장으로 묶이면서 건설사들은 점차 '얼마나 많은 주택을 짓느냐'보다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느냐'를 새로운 경쟁 축으로 삼고 있다.
이런 변화는 정성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수치에서도 감지된다. 특히 일부 주요 대형 건설사는 플랜트·에너지 부문 매출 비중이 과거보다 뚜렷하게 확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택 경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2020~2021년과 비교해 주택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에너지·전력 인프라가 실적 방어 한 축으로 올라서는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흐름은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주요 대형 건설사들은 원전, SMR, 재생에너지, 송전 EPC 등을 중장기 핵심 사업축으로 재정렬하는 분위기다. 주택 사이클에 실적이 과도하게 연동되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수주가 곧 실적" 에너지 EPC가 주택을 대체하는 이유
에너지 전환이 주택 대안으로 부상하는 이유는 사업 구조에 있다.
에너지 인프라는 대체로 공공성·국가 전략과 맞물려 발주가 이뤄지고, 수주 확정시 설계·조달·시공(EPC) 공정이 수년간 이어진다. 분양 성과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달라지는 주택과 다르게 에너지 EPC는 공정 진행에 따라 실적이 단계적으로 쌓이는 구조다. 불황기에도 매출 흐름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에너지 분야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면서 '연간 수주 25조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 현대건설
이 과정에서 경쟁 핵심은 단순 시공 능력이 아닌 △설계 최적화 △핵심 기자재 조달 △공정 통합 △품질·안전 체계 등을 포괄하는 고부가 EPC 수행력이 관건이다.
원전과 SMR처럼 기술·안전 기준이 높은 프로젝트일수록 표준화된 공법과 글로벌 파트너십이 필수 조건으로 작용한다. 재생에너지 역시 발전 단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계통 연계·저장·운영(O&M)까지 엮일수록 사업 구조가 복잡해지고 수행 역량에 따른 격차가 벌어진다.
에너지 전환의 또 다른 특징은 '선별'이다. 모든 프로젝트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국가·공종·발주처 등에 따라 리스크와 마진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 불황기일수록 물량 확대보다 '어떤 수주를 택하느냐'가 중요해지면서 에너지 시장에서도 선택과 집중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전환은 개별 기업 실적과 사업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현대건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플랜트·뉴에너지 부문 매출 비중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실제 현대건설 2025년 연간 수주 규모는 무려 25조원대에 달한다. 이는 "주택만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수치"라며 "에너지·전력 인프라 수주가 수주잔고를 두텁게 만들고 있다"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원전 분야에서는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가 상징적 사례로 거론된다.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사업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중심 '팀 코리아'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시공 참여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발주 구조와 참여 기업 구성이 비교적 명확한 프로젝트로, 주택 경기와 무관하게 중장기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에너지 파이프라인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보다 직관적 변화가 나타난다.
충남 태안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한 GS건설은 신재생에너지 EPC 역량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했다. 재생에너지는 공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준공과 동시에 실적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대체 매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영역으로 꼽힌다.
삼성물산 역시 SMR 분야에 있어 본 EPC 계약 이전 단계인 설계·협력 단계부터 참여하며 파이프라인을 넓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당장 매출 규모가 크게 잡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선점 여부에 따라 중장기 실적을 좌우할 수 있는 분야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규모보다 중요한 '통제' 마진은 공기·원가·클레임에서 갈린다
다만 에너지 먹거리는 전형적 하이리스크·하이리턴 구조다. 공기 지연을 비롯해 △원자재 가격 변동 △설계 변경 △인허가 변수 △안전 이슈 등이 손익을 좌우하고, 계약 구조에 따라 클레임(추가 비용 청구) 리스크도 상존한다. 에너지 전환이 모든 건설사에게 동일한 해법이 되지 않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재생에너지·산업설비 EPC 경험이 누적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격차가 불황기에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수주가 '대체 매출'이 될지, 또는 '대체 리스크'로 전락할 진 결국 통제력이 좌우한다는 분석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0월 GE Vernova Hitachi Nuclear Energy와의 SMR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삼성물산이 스웨던 링할스 지역에 추진중인 SMR 발전소 조감도. Ⓒ 삼성물산
실무적으로는 △계약·원가 관리 표준화 △공정·조달·품질 통합 관리 △도급에 그치지 않는 밸류체인 확장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일부 건설사들이 개발·지분투자·운영(O&M)까지 참여 방식을 넓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단순 시공 마진에 의존하기보다 수익 구조를 다층화해 변동성을 낮추려는 시도다.
탄소중립 솔루션(CCUS)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성장 시장으로 평가되지만, 기술 검증과 규제 정비, 저장 부지 확보, 운영비 구조가 동시에 맞아야 수익 모델이 완성된다.
업계에서는 "에너지 전환 비중이 빠르게 커진 만큼 올해에는 사업 확대와 함께 사업성 검증이 본격화되는 분기점"이라고 바라봤다.
현재 에너지 전환을 '주택 대체 매출'로 명확히 설정한 대형 건설사는 업계에서 손에 꼽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중대형 건설사와 에너지 EPC 전문 기업까지 포함하면 '불황기 생존 전략'으로 에너지 시장에 무게를 두는 기업은 두 자릿수에 근접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과거 선택지 중 하나였던 에너지 사업이, 이젠 실적 구조를 좌우하는 비중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더군다나 주택 사이클이 흔들릴수록 에너지 전환은 건설사에게 대체 매출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에너지 시장은 물량만 늘려선 이익이 남는 구조가 아니다. 공기·원가·클레임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 수주 대상 선별, EPC 역량 고도화 등이 함께 움직일 때만 '마진을 지키는 성장'이 가능해진다.
과연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건설사들이 각종 난관을 이겨내고 적절한 통제 등을 통해 우수한 성적표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이들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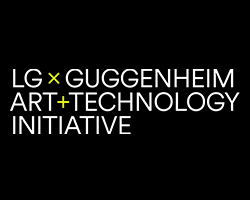





![[포토] 부산 달군 지역 투자 열기 '2026 스타트업 투자 서밋'](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5/art_722321_1769673803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