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차시장, 경쟁력 기준 '전동화 포트폴리오'로 이동
11월 하이브리드·전기 점유율 90% 육박…내연기관 라인업 '리스크 요인'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5.12.03 10:55:59
[프라임경제] 국내 수입차 시장이 11월 다시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11월 신규 등록은 2만9357대로 전월(2만4064대) 대비 22.0%, 전년 동월(2만3784대) 대비 23.4% 증가했다. 1~11월 누적등록대수는 27만8769대로 전년(2만39764대) 대비 16.3% 성장했다.
이번 달 실적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브랜드별 판도 변화와 전동화 트렌드의 가속도가 동시에 확인됐기 때문이다. 테슬라의 강세, 토요타·렉서스의 꾸준한 수요 확보, BYD의 안정적 확장, 독일 브랜드 내부의 양극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장 흐름을 다시 크게 흔들었다.
11월 수입차시장 1위는 테슬라(7632대)였다. Model Y가 4604대, Model Y 롱레인지가 1576대를 기록하며 베스트셀링 1·3위를 차지했다. 북미발 물량공급 정상화와 연말 프로모션이 결합된 데 따른 결과다.
2위는 BMW(6526대)로 여전히 독일 3사 중 가장 공격적인 판매 흐름을 이어갔다. 뒤이어 메르세데스-벤츠(6139대)가 3위에 올랐고, 두 브랜드 간 격차는 387대로 지난달에 이어 BMW 우위가 유지되는 그림이다.

지난 4월 국내에 출시된 New Model Y. ⓒ 테슬라 코리아
또 볼보자동차(1459대), BYD(1164대), 렉서스(1039대)가 치열한 중위권 경쟁을 벌였고 △미니(918대) △토요타(864대) △포르쉐(800대)도 안정적인 판매를 유지했다.
특히 BYD 다시 1000대 선을 넘기며 수입 전기차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절대 규모는 아직 테슬라에 크게 못 미치지만, 중국 브랜드에 대한 초기 저항감이 빠르게 희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수치로 해석된다.
이외에는 △아우디 705대 △폭스바겐 452대 △랜드로버 409대 △폴스타 371대 △지프 216대 △혼다 155대 △포드 133대 △캐딜락 78대 △푸조 78대 △링컨 58대 △마세라티 39대 △벤틀리 35대 △람보르기니 31대 △페라리 27대 △GMC 13대 △쉐보레 9대 △롤스로이스 7대였다.
11월 수입차 등록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연료별 점유율이다. 하이브리드가 1만5064대로 전체의 51.3%를 차지해, 두 달 연속 수입차시장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다. 비중은 10월(59.8%)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수입차시장의 중심 축이 하이브리드임을 보여줬다.
또 전기차는 1만757대(36.6%)로 10월(6922대) 대비 뚜렷한 반등을 보이며, 수입 전기차 수요가 다시 강하게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다. 반면, 가솔린 10.9%(3210대), 디젤 1.1%(326대)는 사실상 비주류로 전락했다.

순수 전기 중형 SUV '씨라이언 7'. ⓒ BYD코리아
이런 모습은 국내 수입차시장이 하이브리드+전기차 중심으로 거의 완전히 재편됐다는 뜻이며, 디젤 중심 전략을 유지하는 일부 브랜드가 더 빨리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가별 비중은 유럽이 61.3%(1만7996대)로 여전히 시장의 3분의 2에 가깝게 점유했다. 미국은 27.7%(8139대)로 테슬라 효과를 톡톡히 봤으며, △일본 7.0%(2058대) △중국 4.0%(1164대)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구매유형별로는 2만9357대 중 개인구매가 1만9136대로 65.2%, 법인구매가 1만221대로 34.8%였다.
정윤영 KAIDA 부회장은 "11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은 10월 추석연휴로 등록대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기저효과와 더불어 각 브랜드의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에 힘입어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내 수입차시장은 이제 명확한 전동화 중심 구조로 접어들고 있다. 11월 실적은 이 변화가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임을 확인시킨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전체의 87.9%를 차지했고, 브랜드별 실적 역시 전동화 포트폴리오의 완성도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올해 들어 테슬라·렉서스·토요타·BYD 등이 빠르게 성장한 반면, 디젤 중심 전략을 고수한 일부 브랜드는 존재감이 크게 흔들렸다. 내연기관 중심 라인업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결국 시장의 초점은 단순한 전기차 확대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합리적 전동화 경험을 제공할 브랜드가 누구냐에 맞춰지고 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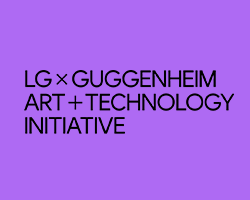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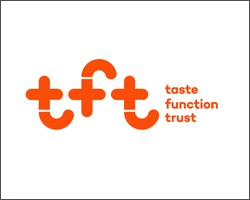















![[포토]](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716010_1765500157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