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많은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투자를 유치하면서 체결하는 주주간계약의 규정 중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규정이 바로 주식의 처분 금지 규정이다.
주식의 처분 금지 규정이란 주주 구성의 변동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창업자 등 초기 구성원들, 즉 스타트업 대표 등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투자자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비즈니스 모델이나 역량 뿐만 아니라, 초기 구성원들의 역량과 인성을 아울러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즉, 투자자는 기술 등 스타트업의 물적 실체 뿐만 아니라, 인물에 대한 신뢰성을 고려해 투자 한다.
만약 창업자 또는 초기 중요 임직원이 갑자기 본인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스타트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다면, 투자자는 창업자를 믿고 투자한 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
주식의 처분 금지 규정은 이러한 투자자의 필요성에 따라 스타트업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조항으로, 구체적으로는 주식의 매각, 양도, 담보설정 등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식의 처분 금지 규정은 일반적으로 유효하고, 매우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무효로 된다. 법원은,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을 밝힌 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608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등).
즉, 주주의 투하자본의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가 되어야지 비로소 주식의 처분 금지 규정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실무상 주식의 처분 금지 규정 자체에는 기간의 한계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주식의 처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주주간계약 자체가 스타트업의 M&A나 IPO, 기타 주주간계약이 종료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를 보충하고 있다.
이러한 주식의 처분 금지 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608 판결 등)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주식의 처분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제3자가 취득하더라도, 그 제3자는 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심지어 주식의 처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하다. 그 제3자는 위 합의에 동의한바가 없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은 창업자 등 초기 구성원들의 비전과 그 비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맨손으로 일구어내는 스타트업 업계 생태계에서는 신뢰를 지키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다.
주식의 처분 금직 규정은 스타트업을 구성하는 신뢰를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식의 처분 금지 규정 그 자체는 물론, 이를 담고 있는 주주간계약의 여러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장창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前 EY한영회계법인 회계사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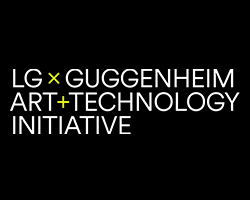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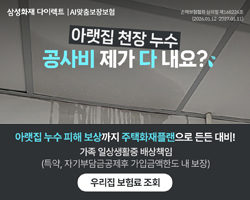



![[포토]](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7/art_724391_1770945420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