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상품의 형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첫 인상을 전달하거나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은 다양한 요건 아래 상품 형태에 대한 각기 다른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특허청을 통한 권리의 등록이다. 우리나라의 특허청은 △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 등록 절차를 두고 있다. 특허청을 통한 권리 등록이 이뤄지면 등록 범위 내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가장 확실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
상품 형태의 경우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디자인권은 해당 디자인이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에 디자인 출원을 하면 해당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보아 등록이 거절되기 때문에 출원 시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주얼리 브랜드 업체인 '제이에스티나'가 귀걸이 디자인의 디자인권 출원 전에 해당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을 드라마를 통한 간접광고 및 잡지 홍보에 실었다가,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이후 디자인권이 무효가 됐다.
상표권의 경우 입체상표 출원을 통해 상품 형태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입체상표란 3차원적 입체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로, 그러한 입체 형상이 특정 상품의 출처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성을 갖추었을 경우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 제품인 '스크류바'도 국내 특허청에 입체상표로 등록되어 있다(상표등록번호 제40-1036102호).
상품 형태에 대한 디자인 또는 상표 등록이 되면 그와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제작 또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을 통한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상품 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상품의 형태에 관하여 주장 가능한 대표적인 조항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자)목 및 (파)목을 들 수 있다.
제2조 제1호 (가)목은 어떠한 상품 형태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그 자체로 차별적 특징이 되었다면 그러한 상품 형태를 모방해 소비자들 간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2016년, 프랑스 명품 업체인 '에르메스'가 자신들의 '버킨백' 형태가 (가)목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버킨백 형태와 유사한 가방을 출시한 국내 패션브랜드 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버킨백' 형태가 (가)목의 보호가 필요할 정도의 저명성을 갖췄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양사 제품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보아 에르메스의 주장을 기각했다.
제2조 제1호 (자)목은 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품 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규정이다. (자)목은 디자인권 등록 및 저명성을 모두 결여한 상품 형태를 보호하는 대신, 3년이라는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이 상당한 투자 및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위반해 이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기존 법률로는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가)목이나 (자)목에 따른 상품 형태의 보호가 어려우면 (파)목을 보충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으나, 각 목의 행위유형에는 해당하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파)목 또한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판례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라면 (파)목에 따른 보호를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상품의 형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또는 상표 등록을 통해 권리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 형태의 신규성이 상실되었거나 식별력이 부족하여 디자인 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 리뷰나 뉴스 기사, 매출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상품 형태의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목의 성립을, 그렇지 않다면 (자)목의 성립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표경민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前 Cho & Partners 변호사
표경민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前 Cho & Partners 변호사ⓒ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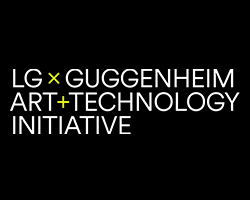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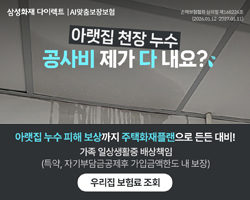



![[포토]](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7/art_724391_1770945420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