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기업의 대처방안 및 주의사항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songwook.kang@dlglaw.co.kr |
2024.11.08 18:40:31
[프라임경제] 지난 2019년 1월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법으로 도입된 이후, 기업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현재 사업장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전제로 제도 구성이 되어 있다. 신고를 받은 기업의 대다수는 이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건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수하게 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가해자의 사과, 재발방지약속을 받는 것으로 피해 회복을 받을 것인지, 정식 조사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가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 후 사업주에게 조사보고, 합의안 도출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식 조사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가 정식 조사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 경우 기업은 신속히 △조사방향 △조사범위 △조사 대상 등을 결정해야 한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측은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당사자들이 조사과정·조사결과를 납득할 만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가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진행된다는 인식 형성이 중요하다. 중립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신고사실에 성희롱 등 성적인 언동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업은 근로기준법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 사실에 관한 조사의무가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2항).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기업이 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조사의무가 발생한다.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나 사실관계 인정은 법원의 재판과 유사한 규범적 판단이므로, 그 기준을 잘 세워야 할 필요도 있다.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내용이 얼마나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지 등이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직장내 괴롭힘은 분쟁이 노동위원회나 법원 단계로 가게 되면 '사업장 내 처리가 정당하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뤄지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가 징계 당부에 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업측의 철저하고 면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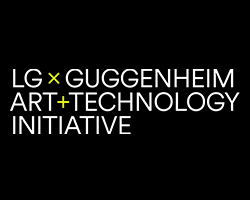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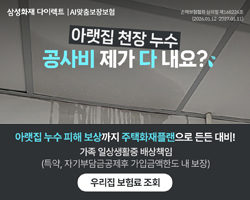



![[포토]](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7/art_724391_1770945420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