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즘 버텨라" K-배터리업계, ESS로 위기 돌파
'폭발적 성장 전망' 2035년 109조원 수준…업계 'ESS용 LFP' 집중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4.06.05 16:20:41
[프라임경제] K-배터리업계가 전기차 '캐즘(Chasm·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ESS(에너지저장장치)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어서다.
최근 전기차 캐즘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올해 1분기 실적이 고꾸라졌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6조1287억원, 영업이익 157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9.9%, 영업이익은 75.2% 감소했다. SK온은 매출 1조6836억원, 영업손실 331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9% 줄었고, 영업손실 폭은 전분기 대비 3000억원 이상 확대됐다.
삼성SDI(006400)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매출 5조1309억원, 영업이익 2674억원을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에 비해서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 28.8%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업계는 ESS에 힘을 주고 있다. 캐즘 현상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우회 전략인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기조가 가속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는 날씨나 계절에 따라 예측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출력변동률이 큰 것이다. 이에 따라 ESS가 주목을 받고 있다. ESS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장치로,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SK온의 LFP ESS 모듈 모형. = 조택영 기자
시장 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ESS 시장 규모는 지난해 대비 27% 늘어난 400억달러(약 54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성장세가 이어지며 2035년에는 800억달러(약 109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미 시장은 지난해 55GWh에서 2035년 181GWh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내 배터리업계는 기존 주력이었던 고가의 삼원계(NCM·NCA 등) 배터리 비중을 낮추고, LFP(리튬인산철) 등 저가의 배터리 생산·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수요가 높은 ESS 시장에서 LFP 배터리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어서다.
ESS용 LFP 배터리 개발을 가장 먼저 완료한 곳은 LG에너지솔루션이다. 지난해 12월 ESS용 LFP 배터리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한화큐셀 미국법인과 4.8GWh 규모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그동안 진행했던 ESS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다.
또 지난해 말부터 중국 난징 공장 라인 일부를 ESS LFP용으로 전환하고, 내년 하반기에 LFP 롱셀 배터리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삼성SDI는 지난해 말 ESS 배터리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2026년 양산을 목표로 LFP 배터리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LFP 배터리 양산을 전기차에 앞서 ESS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SK온 역시 2026년 LFP ESS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 ESS용 LFP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대신 ESS로 간다는 분위기는 아니고,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배터리와 ESS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이다"라며 "현재는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인해 ESS에 더 집중하는 양상이다"라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ESS용 LFP 배터리 개발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기는 했지만, 기술적으로 삼원계 배터리보다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며 "시장이 열리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규모의 경제면에서는 중국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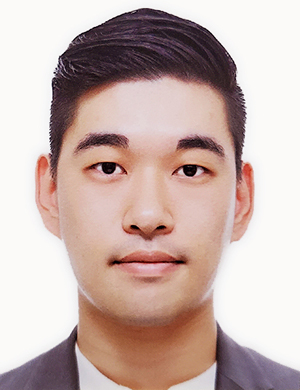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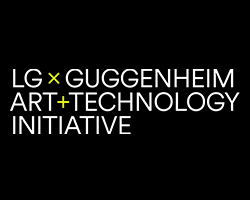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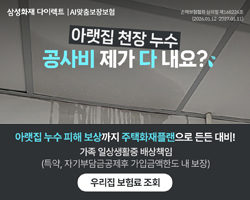



![[포토]](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7/art_724391_1770945420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