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호조' K-방산, 국방 핵심 소재 해외 의존도 심각
'78.9%' 수입 의존…"공급망 자립화 기반 마련 서둘러야"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4.05.10 15:27:24
[프라임경제] K-방산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국방 핵심 소재 수입 의존도는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루빨리 공급망 자립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은 '국방 핵심 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 및 공급망 강화방안' 보고서를 통해 "K-방산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핵심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방 핵심 소재의 공급망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코로나19 여파 △유럽·중동에서의 '두 개의 전쟁' 장기화 △대형 자연재해 △글로벌 공급망 디커플링 심화 등을 꼽았다.
실제 첨단무기 개발과 생산에 필수적인 국방 핵심 소재 중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방 핵심 소재 10종의 총 조달 금액 8473억원 중 78.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속소재(8종)는 조달 금액 8086억원 중 80.4%를, 비금속소재(2종)는 조달 금액 387억원 중 47.5%를 수입했다.

2022년 기준 국방핵심소재의 해외 수입의존도. ⓒ 산업연구원
금속소재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셈이다. 마그네슘 합금과 내열 합금은 100%, 타이타늄 합금과 니켈·코발트는 99.8%, 알루미늄 합금은 94.9% 수입하고 있다.
비금속소재인 복합소재와 세라믹도 각각 47.4%, 51.3%를 수입해 국방 핵심 소재의 상당 부분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국내 국방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도 평가도 5점 만점 중 보통(3점) 이하인 2.67~2.98점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방산기업·소재 전문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방 핵심 소재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사한 결과, 별도의 대응책 마련 계획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기업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응 방안은 △국방 핵심 소재 공급 기업 다변화(10.5%) △자체 비축 물량 확대(7.9%) △기술혁신 통한 대체·저감(5.3%) 순이었다. 수입국 다변화와 해외조달원의 국내 전환은 응답 기업의 2.6%에 그쳐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우선 방산 부품과 같은 수준으로 방산 소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개발-생산-시험평가-인증 등 전 주기 차원의 국방 핵심 소재 자립화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 소재 통계 및 공급망 조사를 정례화해 공급망 취약점을 식별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과 우방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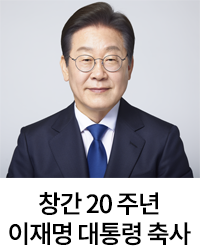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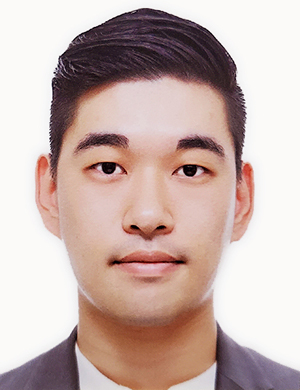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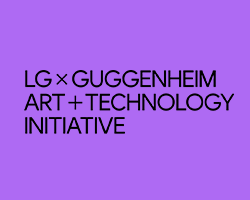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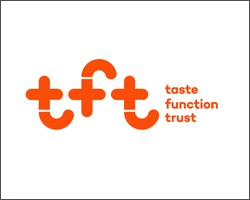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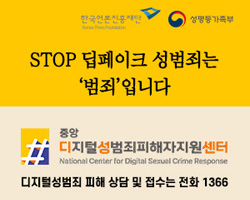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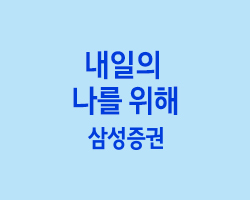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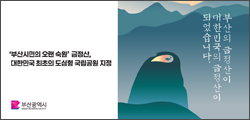


![[포토] 유안그룹](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716774_1766021723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