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울며 겨자 먹는 신생 브랜드…입점 고충
납품사 손실 증가에도 입점 포기 어려움 호소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02.17 10:52:57
[프라임경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당 반품과 독점 거래 강요 혐의를 받는 CJ올리브영을 두고 신생업체의 '호소'가 일고 있다. 올리브영이 브랜드 파워가 필요한 신생 브랜드에 무리한 프로모션 강요와 차별적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직원 성과급까지 지급한 바 있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그러나 올리브영에 입점했다는 홍보만으로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리한 요구에도 일단 입점부터 하고 보자는 신생 화장품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는 신생 브랜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실상 뷰티 시장에 올리브영의 영향력은 크다. 그런데 업체별 계약에 따른 상이한 마진과 개별협의로 분담하는 판촉비용 등 올리브령에 입점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해서다.
여기에 각종 할인행사에 들어가는 비용과 물류비, 사용 수수료 등도 일정 부분 입점 업체의 부담이다.

CJ올리브영 매장 전경. © 프라임경제
업계 관계자는 "카테고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50%의 수수료가 나간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 행사비, 연출물 제작비, 샘플 지원비 등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는 계약상 공급가액을 낮춰서 공급하는 것과 매출 판매에 따른 수수료 모두 적용된다. 다만 카테고리별 수수료는 협의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신생 브랜드의 경우 직거래보다는 밴더 운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할인행사가 있는 달에는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 당연히 추가 개발, 마케팅 투자 여건이 되지 못해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올리브영에 도움 되는 고객사만 선택"…성장 가능성까지 제약
결국 신생 브랜드의 경우 재고 확보와 품질 개발보다는 올리브영 입점이 목표가 돼 버리면서 성장 가능성까지 제약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올리브영) 입점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고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고객사를 밀어주면서 발생한 참사"라고 꼬집었다.
또한 "올리브영의 경우 신생 브랜드의 경쟁력과 상품의 품질보다 당사에 얼마만큼의 수수료와 프로모션 지원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입점을 결정하기 때문에 신생 브랜드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재고 확보 어려움으로 납품기한을 맞추기 힘든 신생 브랜드가 프로모션 기간 내 상품을 넣지 못할 경우 패널티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 기업의 경우 재고 보유가 가능해 올리브영의 요구에 맞출 수 있지만 재고 여력이 부족한 신생업체들에게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적자 부담에도 입점 강행…'후광 효과' 기대
그럼에도 신생 브랜드는 올리브영 입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소 화장품 브랜드로 오프라인 단독 매장을 내기엔 비용 리스크가 크고, 백화점 입점에는 브랜드 파워가 약하기 때문이다. 올리브영 입점 효과로 브랜드력을 인정받았다는 '후광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 입점에 선택지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

© CJ올리브영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중심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도 오프라인 매장에 제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에 영향을 준다. 올리브영 외 입점 기회가 없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이유로 올리브영의 부당한 요구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입점을 결정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납품업체 부당 반품 강요…공정위 '인앤아웃' 편법 동원 판단
이처럼 올리브영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브랜드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올리브영의 입점 업체 갑질 논란이 한 번씩 반복되는 점은 이를 방증하는 사례다.
최근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H&B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지배력 남용은 매출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중징계 사안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올리브영은 지난해 최대 실적을 올리며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했다"라며 "동반 성장을 강조해온 올리브영이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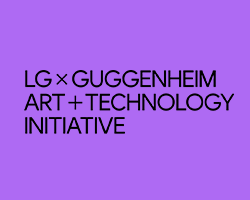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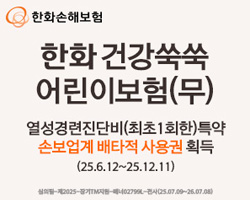






![[포토] 교통안전부터 자동차까지,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0835/art_701697_1756194907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