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운의 꿈을 안고 입행한지 어언…”
“빛나는 졸업장을 받아들고 보니 눈가에 이슬이 살짝…”
“그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차 오일쇼크가 있었고, 10·26사태가 있었습니다. 금융실명제도 있었고 국가부도 사태인 IMF 시대가…”
1970년대 후반 은행에 투신한 이들이 일선을 떠나는 모양입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 21일자 부장급 전보·승진 인사를 앞두고 부장급 이하 올해 마지막 정년퇴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른바 오이회(52년 생)로도 불리는 입행 동기 직원들은 금년에 거의 다달이 두셋(많게는 다섯)씩 연이어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은행의 지점장 및 부장대우급 이하 직원으로, 경제 규모가 작던 시대에 은행원으로 들어와 산업 성장을 지켜본 금융인들입니다. 정년이 빠른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소리 뒤에는 더 승진을 했으면 하는 내용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맞아 퇴직하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리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근래에 명예퇴직이 여러 번 시행됐기 때문에, 몇 년 새 정년퇴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은행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은행이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쳐지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각종 파란 속에서도 큰 몸집을 자랑하는 은행으로 살아남은 데다, 한국 최초의 금융지주제 시행 케이스로 남은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30여 성상(星霜)을 노하우를 쌓고 또 오래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개인에게는 물론 조직으로서도 상당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추억이 알알이 퇴임하는 순간까지도 ‘민영화’니,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 등을 언급하며 마음은 끝까지 우리은행 곁에 두는 경우가 금년 퇴직 우리은행원의 경우 많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 복을 누리고 마지막을 축하하는 데에서는 은행원들의 마음은 이럴진대, 우리은행이라는 조직의 측면에서는 다소 소홀함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정년을 맞는 직원이 거의 없다가 연초에 극소수 인원이 정년을 맞이했는데 이들은 ‘퇴임식’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은행장실에 퇴직자와 가족들을 초청해 조촐하게 티타임을 하도록 하고 감사패 정도를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은 거행하되, 행장은 오지 않고 부행장이 참석하는 게 관행으로 굳어진 우리은행과 대조적입니다.
이순우 행장이 내정자 자격으로 참석 가능했던 3월말 행사부터 치면 여러 번 기회가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신한은행은 정년 퇴임자 초대 티타임에 대해 “아무리 행장님이 바쁘시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오랜기간 근무한 식구들을 위해 차 한 잔 하는 시간도 못 내주시겠느냐”며 전해온 것과 감안한다면 2% 부족한 느낌이 드는 장면입니다.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전 속 단어가 되어 가는 상황에서 떠나가는 분들에 대한 소홀함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조직과 달리 많은 베테랑들을 떠나보낸다는 점은 그만큼 인적 자원면에서 강점을 여태 누려 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순우 행장 체제’가 잘 가동되고 있다는 평입니다. 하지만, 2차 오일쇼크 당시 직장이 겪은 고생을 여태 기억하고, 앞으로도 우리은행이 1등 은행이 되라고 기원하며 회현동 본점 문을 나서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자리 자리마다 행장이 왕림했더라면, 그 첫해의 성취가 더욱 빛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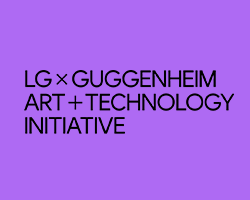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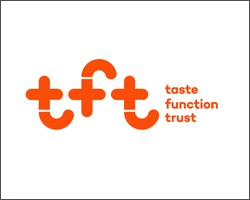



















![[포토] 유안그룹](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716774_1766021723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