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금융감독원이 국제 금융위기 국면을 거치면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에서 이번 정권 들어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상황을 감안해 보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지난 3월 취임 2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지금은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 눈길을 끈 대목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이 합쳐져 금감원으로 일원화된 것이 1999년, 즉 금감원은 IMF 구제금융 위기 정리를 위한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이번 정부 출범 시기에 금융위가 탄생하면서 금감원은 감독규정 개정과 금융회사 인허가, 금융정책 수립 권한을 금융위가 독차지하는 바람에 단순 감독·검사기관 신세로 전락했다는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까지 겪었지만, 2008년 이후 국제 금융위기로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계속되던 위상 약화 우려에 제동

<사진=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위의 권한 강화, 그리고 금감위 시절처럼 양 기관 수장이 겸직하지 않고 서로 다른 수장이 이끄는 분리 상황까지 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불편한 불협화음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례로 금감원이 2008년 8월 금감원이 주식 공매도 현황을 검사한다고 발표하자 금융위에서 사전 협의 문제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다음해 10월에는 금융감독 과제를 다룬 한국판 ‘터너 보고서’ 발표를 둘러싸고 금감원이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가의 문제로 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같은 권한과 위상 축소 상황은 금융소비자원 설립 문제와 금년 초 은행법 개정 문제로 극에 달했다.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감독 기능 중 상당 부분이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되고 은행 임직원 제재 권한을 금융위 이관 등을 모두 추진하게 되면 금감원의 ‘이’가 모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22일 국회에서는 결국 은행법의 제재권 이관을 백지화한 채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소비자원 발족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사실상 현행 체제의 변경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는 것도 금감원으로서는 유리한 대목이다.
◆민간기구 감독 논쟁 ‘일단락’
이번 은행법 논란은 민간기구(특수법인)인 금감원이 같은 민간인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할 수 있느냐는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해야 하는 작용이라는 주장에 줄곧 발목을 잡혀 온 금감원이 논란의 고비를 넘긴 것이라 특히 주목된다.
과거 이번 정부 출범 직전(인수위원회 시절) 논의되던 금감위-금감원 역할개선방안 중 일본식 금융청으로의 통합(공무원 조직), 영국식 금융감독원(민간기구)로의 통합, 현재의 금융위(행정조직)-금감원(민간기구) 이원화 중에서 세번째 안으로 정리된 바 있다. 이같은 개편은 금감원에 계속 일종의 ‘유리천장’으로 작용해 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업평가시스템 및 조직개편 등 관심
이에 따라 금감원이 앞으로 한층 자신있게 금융당국이 세계 금융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조직 개편 카드와 권한의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조직 개편을 위한 외부 용역 연구를 맡긴 것으로 알려진 상태이며, 조만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금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 감독 체계를 기반으로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업무 체계를 업종별로 직무를 보던 체계를 기능별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개편되면, 특정 이슈가 생기면 업권별 ‘벽’을 의식하지 않고 이슈별로 업무추진이 가능해진다.
자본시장통합법 시대 개막으로 향후 금융기관들의 업무가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금감원 역시 보다 ‘매트릭스 조직화’로 탄력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둘째로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은행 여신관리에 대한 판단 지표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기업 구조조정 문제 매듭 등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셋째, 조인선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후감독권을 금감원에 주기로 구상하고 있는 점 등도 위상 강화의 키워드로 읽힌다.
금융투자업 개정안에 대한 발의는 이전에도 여러 건이 이뤄졌으며 수정발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감독을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중 어느 곳에 주는가가 논란이 됐다가 결국 금투협에 부여됐었다. 이같은 추가적인 법안 추진으로 금감원이 ‘세계 최초로 파생상품 사전 규제 권한을 갖는’ 부담을 덜면서도 각종 문제 상황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헌재식 금감위 질주와 유사?
이 같은 금감원의 발전 방향과 행보는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금감위가 돈줄과 여론을 잘 활용하면서 기업 구조조정 국면을 잘 처리한 상황과 유사해 특히 눈길을 모으고 있다. 당시 이헌재 금감위는 은행을 통한 여신 관리를 무기로, 금감위-금감원의 유기적 작업으로 부실기업 정리와 기업 살리기에 깊이 관여했다. 금년 봄의 금감원 위상 변화와 변화 모색은 금감원이 앞으로도 은행 제재권을 여전히 갖고 일선감독을 하는 기관에 만족하지 않고 금융위기 해결이라는 대형 과제를 처리하는 역할을 위한 ‘체력 최적화’에 들어간 것인만큼, 앞으로의 역할에 주목된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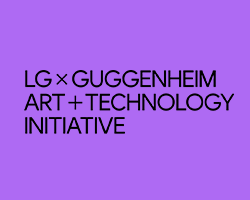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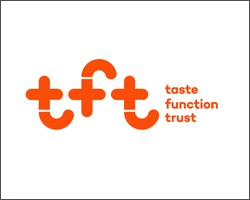















![[포토] 유안그룹](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716774_1766021723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