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갇힌 건설①] 주택부흥시대, 돈이 굴러들어온다
'주택 올인' 시대의 끝…안정적이라던 주택사업, 언제부터 '위험자산'이 되었나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5.11.25 17:42:18

2019년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에 주택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분양 호황에 편승해 주택사업에 올인했던 건설사들이 흔들리고 있다. 한때 '안전판'이던 주택 중심 구조가 지금은 실적 둔화의 출발점이자 인프라 역량까지 약화시키는 약점으로 드러나면서, 업계 전반에 포트폴리오 재정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과거에는 통했던 안정 전략도, 앞으로는 시장 변화에 맞춘 유연한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평가다.
아파트 보급과 함께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던 시절, 건설업은 국가경제를 끌어올린 대표 산업이었다. 해외 플랜트 수주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며 한국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했다. 비록 최근 들어 첨단산업에 가려 예전만큼의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국가 기반을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라는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
건설산업은 크게 공공·민간 발주 여부와 공정 종류에 따라 나뉜다. 공공 발주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하는 만큼 수익성은 낮아도 정산 리스크가 적고, 반대로 민간 발주는 수익 기대치는 높지만 정산 불확실성이 뒤따른다.
공정 유형에 따라 건설사업은 크게 주택(단독주택·아파트 등), 토목(도로·철도·교량 등), 건축(사무·상업·의료시설 등), 플랜트(오일·가스 처리, 정유 및 석유화학 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국내 건설사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부문은 단연 주택과 건축이다. 건설산업연구원 자료(2023년 기준)에서도 상위 대형사 대부분이 전체 수주의 65% 이상을 이 분야에서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국내 주택시장이 호황을 이어온 반면, 중동 정세 불안과 저유가 여파로 해외 플랜트 발주가 위축되면서 자연스럽게 주택사업 쏠림 현상이 가속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사업의 높은 수익성도 이러한 집중을 부추겼다. 평균 8~10%대 영업이익률은 토목이나 플랜트보다 월등히 높았고, 정비사업 중심의 사업 구조는 위험 대비 수익을 확보하기에 유리했다.
이러한 상황에 2015년 당시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보면, 2015년 5월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액은 58조447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7.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등을 포함한 건축 부문은 37조139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18조6418억원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아파트 호황 뒤에 가려진 구조적 취약성…건설업계 재편 압박 커져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주택경기와 해외건설 흐름이 어긋나면서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고, 그 결과 건설사들의 수주 비중도 자연스럽게 달라졌다…다만 주택 호황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만큼, 해외시장 침체가 조속히 풀리길 바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분양시장이 둔화되면서 주택 중심 구조가 오히려 건설사 실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토목·인프라 분야는 지난 10여년간 40% 이상 축소되며 기술력과 수행역량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단순한 사업 다각화 부족을 넘어, 장기적인 경쟁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예전처럼 주택 하나만 잘하면 돈을 버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부 상위사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일 뿐, 영업이익 3% 미만인 회사도 적지 않다. 분양가 상승으로 '토건 카르텔'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과 달리 실제 이익률을 살펴보면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다.
결국 건설사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주택사업에 집중해온 전략은 과거에는 통했을지라도, 앞으로는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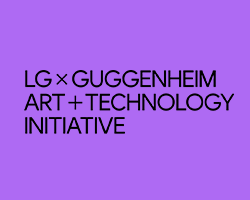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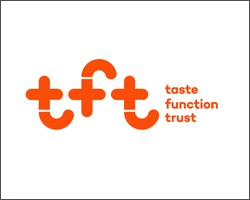











![[포토]](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716010_1765500157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