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부동산 임대소득, 소수 고소득층 집중 현상 뚜렷
차규근 의원 "조세 형평성 확보 위해 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면 개선 필요"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5.10.24 14:10:07

강남 아파트 일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부동산 임대소득이 소수의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상위 0.1% 임대소득자는 연 7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는 반면, 하위 50%는 연 664만원에 불과해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천분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에 해당하는 427명의 주택임대소득 총액은 28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수입은 6억7497만원으로, 5년 전인 2019년(4억9881만원)보다 약 1억7600만원, 즉 35.3%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임금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상위 1% 임대소득자(3815명)의 1인당 수입도 2019년 1억6486만원에서 2억1922만원으로 33% 늘었다. 상위 10%인 약 4만3000명의 임대소득 총액은 3조3112억원으로, 전체 임대소득의 39.9%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21만 명)의 총수입은 1조4204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연 664만원에 불과했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55만원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차 의원은 "고소득 임대인의 수입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절반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생계보조 수준의 소득을 얻는 데 그치고 있다"며 임대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 과세 체계가 이런 불균형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등록임대는 필요경비율 60%, 미등록임대는 50%가 적용된다. 실제보다 높은 비용이 인정되는 구조다.
또 월세 소득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 이상일 때 과세되며,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부터 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임대 수입이라도 전·월세 형태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비합리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차 의원은 "상위 0.1% 임대소득자가 연 7억원 가까운 수입을 올리며 부동산 부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할 때,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나 과도한 필요경비율 적용이 정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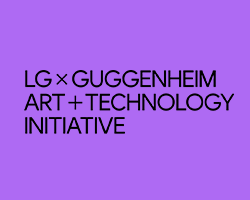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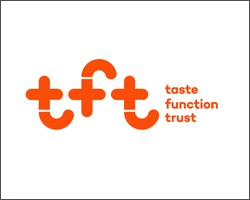














![[포토]](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716010_1765500157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