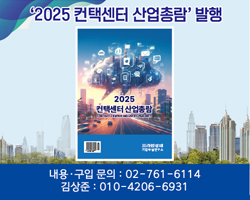'관세 폭탄 일시 정지' 트럼프, K-석유화학 '예의주시'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일단 안도…정부 지원 포함 대비책 시급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5.04.10 14:25:14
[프라임경제]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발 상호관세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0일간 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향후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이 때문에 국내 석유화학업계도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게 됐다.
안심할 수는 없다. 앞으로의 대비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다른 산업군에 비해 대미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전 등 주요 산업이 전방위 관세 여파로 위축되면, 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 ⓒ 롯데케미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제품의 전체 수출 물량 중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8.9% 수준인 43억달러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36.9%)에 비해서는 비중이 작지만, 미국은 여전히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이처럼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세 조치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교역 환경 위축과 유가 하락 등 간접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 분쟁으로 수입 규제, 반덤핑 조사 등 교역 환경이 위축될 경우 실물 경기가 둔화하고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태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업계에 단기적으로는 원가 부담 감소 효과가 있지만, 재고자산평가 손실이 심화해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장기간 불황을 겪고 있어 통상 환경에 대한 시름이 더 크다.
여기에 더해 관세 조치 대비를 위한 미국 현지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화학 산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소요되는 자본 및 기술집약형 장치 산업으로, 1개 단지 건설에 40억달러 전후가 투입되고 건설에도 3년 이상이 소요된다.
일부 기업은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으나, 해당 공장들은 이미 용도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관세 돌파구로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롯데케미칼(011170)은 루이지애나 주에 에틸렌 100만톤, 모노에틸렌글리콜(MEG) 70만톤 규모로 범용 제품을 생산 중이다. LG화학(051910)도 오하이오 주에서 연산 3만톤 규모의 ABS 컴파운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쳤다. 그동안 이어진 탄핵 정국에 이어 6월 초 대선으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의 주도적 역할보다 기업들의 자율 구조조정을 측면 지원하는 데 그쳐 후속 대책이 요구됐고, 정부는 올 상반기 내에 새 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발표까지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인해 최소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미국발 관세 조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산업 전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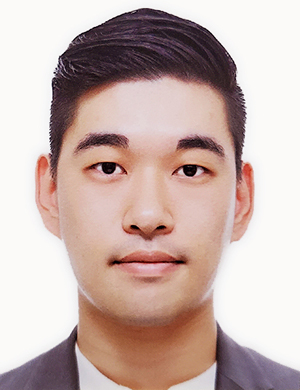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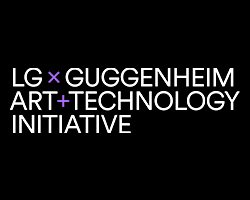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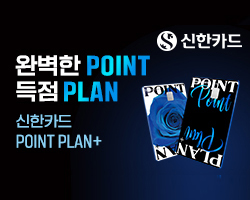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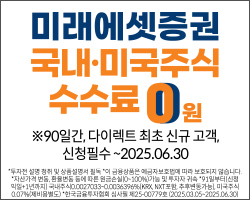




![[포토]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이 겹친 특별한 연휴](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0519/art_687314_1746682756_245x14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