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시선 바이오항공유로, 정부 뒷받침 목소리↑
'석유사업법 개정안 통과' SAF 생산 법적 근거 확보…탄소중립 시대 '새 먹거리'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4.01.30 15:55:55
[프라임경제] 최근 바이오항공유(SAF) 생산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면서 정유업계의 시선이 SAF로 쏠리고 있다. 기존 항공유와 비교해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어, 탄소중립 시대의 새 먹거리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연합(EU) 수준의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잇따른다.
SAF는 석탄이나 석유 대신 △폐식용유 △동식물성 기름 △옥수수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생산하는 친환경 항공유를 뜻한다. 기존 원유 기반 항공유 대비 80%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연료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EU가 항공유의 SAF 의무 포함 비율을 2025년 2%에서 2050년 7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 시장이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모더인텔리전스는 글로벌 SAF 시장이 지난 2021년 7억4550만달러(약 1조원)였으나, EU의 규제가 본격화하는 2025년엔 100억달러(약 13조원)로 커진 뒤 2035년에는 215억달러(약 28조원) 규모로 확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25년 80억톤 △2030년 230억톤 △2040년 2290억톤 △2050년 4490억톤 등의 글로벌 SAF 수요를 전망했다.

김포국제공항에 항공기들이 서 있는 모습. = 조택영 기자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흐름과 다르게 그동안 한국에선 자연산 원유로만 항공유 같은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유사들의 SAF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됐다. 즉, SAF 생산에 있어 '불법'에서 '합법'으로 거듭난 셈이다. 개정안에는 석유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 허용 등이 담겼다.
이에 발맞춰 국내 정유업계도 SAF 생산라인 확보와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SK이노베이션(096770)은 오는 2026년 SAF 상업 생산을 목표로 울산 생산거점(CLX)에 관련 설비를 구축 중이다. 또 미국 펄크럼을 통해 합성 원유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에쓰오일(010950)은 지난 2021년 삼성물산과 '친환경 수소 및 바이오 연료 사업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재활용 전문기업 DS단석과 친환경 저탄소 연료 및 화학제품 원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SAF 등 저탄소 연료와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바이오 원료·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초도 물량의 정유 공정 투입을 시작했다.
GS칼텍스는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과 인도네시아 바이오 원료 정제 공장을 설립 중이다. 양사는 인도네시아 원료 정제 공장을 중심으로 SAF 등 차세대 바이오 연료 사업에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 1만㎡ 부지에 연산 13만톤 규모의 차세대 바이오디젤 제조 공장을 조성하고 일부 설비를 수소화 식물성 오일(HVO) 생산설비로 전환해 차세대 SAF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정유사들이 SAF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선 해외처럼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현지에서 SAF를 생산하는 정유사에 갤런당 최대 1.7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미국 등 선진국의 제도적 지원 흐름에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상범 대학석유협회 실장은 "보조금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SAF에 대한 미국의 지원책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리터당 500~600원 정도인데, 그 정도의 보조금이 주어져야 시장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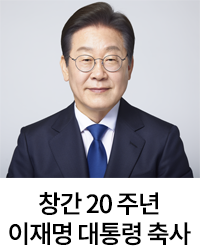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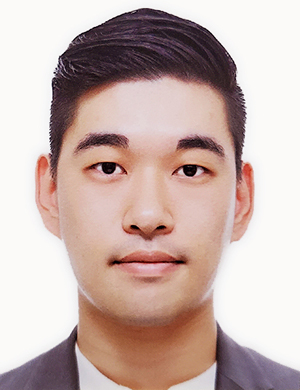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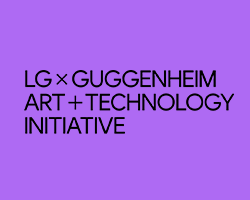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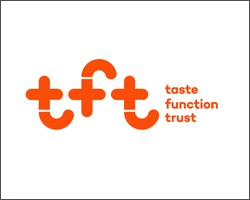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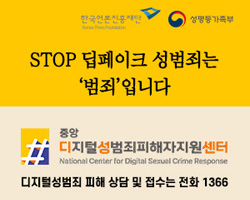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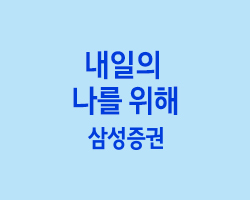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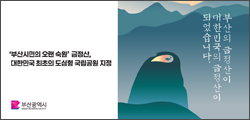


![[포토] 유안그룹](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716774_1766021723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