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을 일부 국내 언론이 오역, 해석기사를 작성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오역에 따라 마치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된 것에 따른 것인데, 문 대통령의 국제연합(UN) 총회 참석 일정을 고려해도 강한 유감 표시로 읽혀 관심을 모은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을 오역, 문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언급한 '가스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것처럼 기사를 썼다.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 시간 기준 17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지난 밤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면서 "북한에선 주유하려 길게 줄을 서고 있다(Long gas lines forming in North Korea)"고 덧붙였다. 대북 압박으로 북한 연료 사정이 어렵게 돌아간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우리나라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도하면서 뒷부분을 오역했다. 주유하려고 길게 줄을 서고 있다는 부분을 '긴 가스관이 북한에 형성 중'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한-러 가스관이 우회적으로 북한에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추가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을 통해 한국과 북한,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사업 구상을 밝힌 부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을 제시했다.
이는 문제의 문장 뒤에 'too bad'라는 표현이 있어 오독 가능성을 키운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에 기름을 사기 위한 긴 줄이 형성된다고 무미건조하게(청와대 관계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해석하면, 이 아주 좋지 않다는 표현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약간 의아해진다.
다만 문 대통령과의 통화 더 넓게는 북한과의 대결 상황 흐름에 대한 불만이라기 보다는, 북한이 고생하는 데 대한 만족 즉 반어법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번 의사 표시는 이렇게 모호한 상황에서 무조건 '한-미 갈등론 프레임'으로 문제를 보지 말아달라는 항변으로 읽힌다. 국내 언론의 '코리아 패싱 걱정'이 수위 조절을 잘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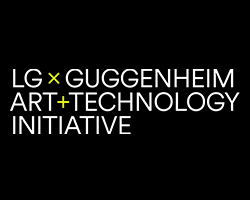



















![[포토] 유안그룹](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716774_1766021723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