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을은 발에 채는 것들이 많은 계절이다. 그중에서 붉거나 노랗게 물든 색색의 낙엽들은 내가 가려는 길 위를 소복하게 덮고 있어서 발에 자주도 챈다. 사각사각, 밟는 소리마저 아련하게 들린다. 그러고 보니 가을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점잖이 아늑하고 세련됐다. 나는 그런 가을을 자주 염탐했고, 시샘했다.
얼룩진 낙엽이 마냥 좋게 보일 수만은 없다며, 다른 눈을 가지려고 시도했다. 그러고 보니 낙엽은 낙하하는 시간의 부유물 같았다. 시간의 절정에서 소리를 내질렀던 당찬 포부와 야망은 온데간데없이 정상에서 속절없이 떨어진 심정이 오죽할까 싶었다. 어쩌면 낙엽도 내가 겪었던 절망감을 어느 정도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너와 내가 벗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다.
다시 낙엽이 늘어선 거리를 걷다가, 힘이 잔뜩 든 두 발에 엉켜 자꾸만 흔들대고 촐랑대는 낙엽들이 성가셨다. 그것들은 참 염치도 없어 보였다. 제 힘으로 지탱할 줄도 모르고, 그저 가볍게 이리저리 차이는 꼴이란. 발끝에 튕겨져 나가는 낙엽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처량함도 새어 나왔다. 어쩌면 낙엽도 만사에 이리저리 치이는 나와 비슷할 만도 했다. 그렇다면 너와 내가 정말 벗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때 다시 낙엽을 바라봤다. 제각각 색을 뿜으면서 열렬한 순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어우러져있던 공간에서 떨어져 나왔는데도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 외려 하나의 주체로 완전해진 것 같다며 지금을 즐거워하는 듯했다. 온전한 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며 외쳐대는 것 같았다. 어쩌면 낙엽은 나보다 살아있음의 순간을 제대로 느낄 줄 아는 벗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아무리 달리 생각해봐도 낙엽의 인생은 우리네 인생과 닮아 있었다. 연대 안에서 무리 지어 살다가 때가 되면 품에서 벗어나, 결국 열렬한 고독을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사이클처럼 말이다.
낙엽이 가을을 장식하는 역할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쯤해서 인정해야만 한다. 삶이란 게 거창하게 있어 보이거나 화려하게 채워져야 될 것만은 아니다. 삶은 한 잎 한 잎 떨어진 체 모퉁이에 홀로 남겨져있어도 제 빛을 내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낙엽의 일생이고, 우리네 일생일 수도 있다.
알록달록한 나무들 위로 노을이 지는 무렵, 나는 둔치에 앉아 가만히 풍광을 들여다봤다. 뭔가 특별하지도 빛날 것도 없는 하루가 이렇게나 허무하게 지나가는데 노을이 지는 하늘은 왜 그토록 아름다울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자니 별 것 아닌 나도 소중한 존재인 것만 같았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이뤘든 간에 나는 낙엽을 밟고 있었고,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얼마든지 느끼고, 감동받을 수 있다. 낙엽이 지거나 노을이 지고, 바람이 이는 자연의 섭리는 내 삶의 '알참'에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인생을 알차게 꾸미는 것이 스스로가 집착하는 허상이란 것을 안다면, 평범하고 별 것 없는 일상이 금세 환희로 가득 찰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별거 없는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말며, 아쉬움 또한 내비치지 않으면 좋겠다. 너와 내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존재의 가치는 어떤 기준으로도 감히 평가될 수 없다. 단지 살아 숨 쉬며 오늘을 사는 것만으로 우리는 세상에 증명된다.

이다루 작가
<내 나이는 39도> <기울어진 의자> <마흔의 온도> 저자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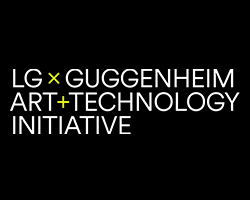



















![[포토] 유안그룹](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716774_1766021723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