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언제부턴가 신조어가 된 기표에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물론 기표야말로 온갖 이데올로기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리하여 그 분열의 확산이 이전에도 무수히 발생했겠지만, 오늘날 2030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어떤 기표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선과 계급이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여기서 기표란 페르디낭 드 소쇠르가 정의한 기호의 근본을 이루는 두 성분 기표와 기의를 뜻한다).
말하자면 '퐁퐁남'이라고 불리는 기표가 그러하다. 퐁퐁남은 '설거지'를 하는 배우자들을 조롱하는 신조어다. 가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발언권이 약하며,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인 제약을 요구받는 등 노예와 다를 바 없는 비참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 : 나무위키)
그러므로 '퐁퐁남'은 자기 연민이거나 자신을 기꺼이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신조어가 아닐까 한다.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한 공간에서 함께 삶을 살아내기로 한 약속이다.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 사유하는 공간에는 뚜렷한 선이 없거니와 분열이나 분리 따위로 합치된 영역을 나눠서도 안 된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서는 탐닉과 소비를 위한 획득과 소유의 총량이 삶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보니, 결혼생활의 영역 안에도 그 같은 물화(reification)의 바람이 일고 있다.
하나의 온전한 기표로 생각해야 할 '우리'가 너와 나, 더 가까이 보자면 너의 몫과 나의 몫으로 분리되어 저울질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둘로 분리된 부부가 공공의 영역 안에서 함께 사는 게 여간 애처롭지 않을 수 없겠다. 모든 움직임에는 제약이 따를 것이고, 때로는 불편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 '너'가 차지한 공간에서 밀려난 '나'의 공간의 협소함이 못마땅하고, '나'의 몫으로 전가된 '너'의 할당량은 그지없이 가볍게만 보인다. 점점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될 것은 자명하고, 그럼으로써 내 처지를 돌아보게 된다.
그러나 '나'의 관점으로 삶을 돌아봤을 때 보이는 것이라곤 나에 대한 측은(惻隱) 뿐이다.
결국 '나'는 '너'보다 많이 일했으면서 많이 즐기지 못했고, 그리하여 '너'보다 많이 누리지 못한 것들로 인해 자기 연민이 생긴다. 여기서 비롯된 계산된 삶의 항목들은 더 이상 결혼생활을 평화롭게 이을 수 없게 된다. 마치 아침 드라마에서 자주 보이는 클리셰의 한 장면 같지 않은가.
자신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다. 대개 그런 생각의 저변에는 '때문에'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다. 측은한 마음은 어떤 상황과 인물로 인해 닥쳐오는 애처로운 감정이다. 즉, 대상(對象)에서 비롯된 마음 상태다. 그렇기에 대상(對象)에 대한 원망에서 한 발짝 물러설 필요가 있다. 화살의 방향이 어딘가에 향해있을 때, 결국 자신은 저격수가 된다.
이는 비단 결혼 생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관계의 양상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갖가지 상황들 또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불능의 아이콘이 되고 만다. 결국 문제에 관한 어떤 원인도 내 안에서 찾을 수 없게 된다. 내 안의 무결점이 나를 지탱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그럴수록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악순환을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시대의 한 축을 세우는 젊은 세대에서는 무수히 탄생되는 새로운 기표(신조어)에 대해 일각의 각성이 필요한 때인 듯하다.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롤랑 바르트(1915~1980)의 저서 A Lover's Discourse:Fragment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Language is a skin: I rub my language against the other. It is as if I had words instead of fingers, or fingers at the tip of my words. My language trembles with desire.(언어는 피부다: 나는 그 사람을 나의 언어로 문지른다. 마치 손가락 대신에 언어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듯이, 또는 내 말 끝에 손가락이 달려 있기나 하듯이. 나의 언어는 욕망으로 전율한다.)" (출처 : 재인용/연인의 담론: 단상|작성자 JDL)
바르트처럼, 타자에게 건네는 언어를 살갗처럼 여기면 어떨까. 조심히 다가가서 거칠지 않게 포근히 어루만져 줄 때 어느 누구도 거칠게 대항하지 않는다. 외려 타자는 조심스러운 표상을 거부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퐁퐁'으로 자신을 치장하기 전에 -거친 기표에 자신을 몰아넣기 전에- 오물이 묻어있는 그릇부터 깨끗이 닦아보자. 한결 가뿐해질지니.

이다루 작가
<내 나이는 39도> <기울어진 의자> <마흔의 온도> 저자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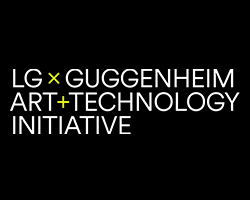



















![[포토] 유안그룹](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716774_1766021723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