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얼마 전 다섯 살 큰 아이가 늦은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 "헐~아빠는 완전 만날 뉴스만 보네. 베론쥬빌이야?"라고 말했다.
전날 잠들기 전 부모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엄마 아빠가 옆에 누우니 양쪽에 날개가 생긴 것 같다"라고 말하던 천사 같은 내 아이의 말이라 자못 충격으로 다가왔고 알아듣지 못할 말에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무엇보다 두 아이의 아비 노릇을 하는 기자이다 보니 아이들의 언어습관에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다. 70~80년대 어린 시절에는 만화잡지나 무협지를 통해 익힌 꾸짖을 갈(喝), 놀랄 하(嗬), 감탄사 호(乎) 등의 단음을 유행어로 사용했다면 요즘 아이들은 헐, 즐, 님 등을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언어습관이 우리 국어를 헤친다는 구태의연한 모범적 계몽을 하고 싶은 게 아니다. 큰 아이가 내뱉은 '베론쥬빌'이라는 말을 듣고 아이와의 정서적 이질감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순우리말에 대한 기자적 견해를 간략히 언급하고 싶은 것뿐이다.
지금은 가십이슈로 전락한 심형래 감독의 지난 2007년작인 '디 워'에서 '부라퀴'라는 생소한 명사가 쓰이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부라퀴는 '자신에게 이로운 일이면 기를 쓰고 덤벼드는 사람'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이후 잠시 순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애매모호한 문장들이 각종 게시판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도 웹 바다를 서성이다보면 미리니즘(스포일러), 커리쉴하프(마을 수장의 전쟁 도구), 베론쥬빌(배신을 당한 여성), 어라연히프제(치마를 입고 활을 쏘는 여성) 등의 이질적인 단어를 쉽게 볼 수 있다.
이 단어들은 나름의 근거와 출처를 갖춘 것처럼 보이나 사실 어느 국어사전을 뒤져도 어원을 찾기 힘든 말들이다. 인터넷 상에 유포된 이러한 근원 없는 순우리말들은 기존 우리말에서 파생되거나 합성된 것이 아님에도 순우리말인 것처럼 포장된 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재밌는 사실은 걸그룹 2NE1 멤버인 산다라 박의 '산다라'는 굳세다는 뜻을 지닌 신라 김유신 장군의 아명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삼국유사에서는 김유신 장군의 등에 일곱 개의 점(点)이 있어 응칠(應七)이라는 아명으로 불렸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장군의 본관인 김해김씨 문중에 확인한 결과 역시 장군의 아명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도 '산다라'라는 단어 자체가 어원을 파악하기 힘든 말이라고 설명했다.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멤버인 나르샤도 용비어천가의 '해동육룡이 나르샤…'에서 '날아오르다'라는 뜻의 고유어로 어원을 찾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일반 명사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순우리말인 미르(용), 타니(귀걸이), 다솜(사랑), 미리내(은하수), 가람(강), 도투락(리본) 등은 잘 알려져 있으나 이외에도 귀에 착착 감기는 우리말은 부지기수다.
먼저 눈에 비친 사람의 모습을 뜻하는 '눈부처'를 포함해 가리사니(사물을 판단하는 지각), 에멜무지로(단단하게 묶지 않은 모양), 하야로비(해오라기), 가리온(몸은 희고 갈기가 검은 말), 보늬(밤이니 도토리 따위의 속껍질), 도로래(땅강아지) 등의 명사가 그렇다.
흔히 마술을 할 때 주문처럼 외치는 '수리수리 마수리'는 불교 경전인 천수경의 '수리수리마하수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우리말의 '수리수리'는 '눈이 흐려 보이는 것이 흐릿하고 어렴풋한 모양'을 뜻하는 부사다. 역시 부사인 짜장(과연, 정말로)과 파니(아무 하는 일 없이 노는 모양)도 사랑스럽기는 매한가지다.
또 맛조이다(귀인이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받들어 맞이하다), 흐놀다(무엇인가를 몹시 그리면서 동경하다) 등의 동사도 애정을 담을 만하다.
이처럼 생소하지만 의식 저 건너편에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말들은 얼마든지 있다. 생소함은 의식의 전 환을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한다. 기사를 쓸 때 기사체가 열 손가락 마디마다 박혀 키보드에서 움직이는
 |
||
매일 쏟아지는 사회·경제적 이슈와 항상 맞부딪혀 어지간한 리스크에는 큰 충격을 받지 못하는 매너리즘에 빠진 기자의 변명일 수도 있지만 문명화한 사회에서 언어는 이미 무의식적 영역에 위치하는 듯하다.
결국 제대로 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의식의 각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르는 것이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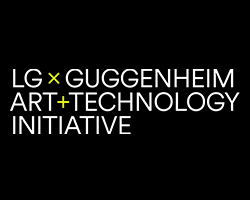



















![[포토] 유안그룹](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716774_1766021723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