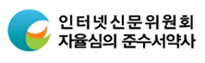중세유럽 뺨치는 '교직원만의 천국' 한국 국립대학법인화 문제, 왜?
독일-프랑스 뼈저린 수술할 때 외형만 수입 '참여정신' 부스터 이식 필요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6.05.18 18:35:34
[프라임경제] 인사와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위해 추진된 국립대학법인화가 운영상 부작용을 보여 관련 제도의 전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법인화된 국립 서울대와 인천대 등의 운영 실태 감사를 벌였으며 32건의 문제를 적발했다.
서울대는 2013∼2014년간 법령에도 없는 교육·연구장려금 명목으로 교원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188억원, 2012∼2014년에는 맞춤형 복지비 명목으로 직원 1인당 500만원씩 54억원을 지급했다. 2013년 8월에는 교육부가 폐지한 교육지원비를 계속 지급하다가 작년부터는 아예 기본급에 산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2∼2015년에 법적 근거 없이 초과근무수당 60억여원을 지급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천대 역시 2013년 법인화 이후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왔다. 보수 규정을 마련하는 대신 노사 합의를 내세워 2014년 인건비를 전년대비 5.9% 인상하고, 인력 수요와 관계없이 4급 이상 상위 직급 정원을 76명에서 131명으로 두 배가량 늘렸다.
이처럼 교육 당국이 국립대법인화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을 놓고 프랑스 제도를 성급히 수입한 데 따른 부작용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귤이 회수를 건너니 탱자가 된' 상황이라는 것.
◆서울대 방만 운영 '당국 간섭 우려' 의심이 낳았다?
과거 학교 등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영조물 이론으로 설명해왔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 시대에 법인화 논의가 시작된 이래,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기 세계화 추진 등에 맞물려 추진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일본에서도 2004년 4월부터 89개 국립대가 법인화됐고 독립법인 도쿄대는 일본 최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가장 높은 투자등급인 트리플A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립대학법인화가 한때 대세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국립대학법인화 추진에는 운영의 묘를 살릴 균형 감각과 당국의 조언자 역할이 절실하나, 이것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이 따른다. 여기에는 과거부터 국립대학법인화 이후에도 정부가 재정 문제를 빌미 삼아 시시때때로 독립성을 침해될 것이라는 '뿌리깊은 오해' 역시 작용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2006년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등장한 이래(이하 특별법), 많은 학문적 논의들은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재정의 확보와 자율적 운영이라는 균형점 도출임을 지적했다.
법학자인 채형복 경북대 교수가 2007년 쓴 '프랑스 대학 자치 제도와 우리나라 국립대 법인화에 관한 법적 문제' 등이 그 예다. 이런 점에서 이미 언급한 특별법은 출연금 산정과 지불 방안에 대해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이때도 거론된 것.
채 교수는 2007년 논문에서 국립대학법인화 단행 시 재정 문제는 교육부장관 손에 맡길 게 아니라 프랑스처럼 국가의 손에 달린 문제로 봐야 한다고까지 지적했다.
그러면 프랑스가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의존하면서도 대학 측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성공적인 길을 걸어온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우리나라 국립대학법인화가 해외 제도의 기형적 수입 결과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법인화가 단행된 바 있는 서울대 전경. ⓒ 뉴스1
문제는 특별법의 기조를 이어받아 각 대학별 법인화의 근거법이 마련됐지만, 이 지적을 받은 틀과 한계를 깨지 못했다는 데 있다.
실제 서울대를 법인화하는 개별근거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법)을 보면, 제29조와 제30조 등에서 법인화 추진 이전의 지원에 상당한 지원 의무만 강조할 뿐, 교육부장관의 재량이나 감시에 의한 필터링 가능성은 확고히 마련된 것이 없다.
같은 법 대통령령에 의해 근거 산정을 하게 돼있으나,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풀린 서류를 걸러내거나 정책적 판단에 기해 제어할 여지가 적어 결국 방만한 운영 예산이 새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번 조사에서도 교육부는 사실상 실태도 모른 채 서울대 출연금을 2012년 3409억원, 2013년 3698억원 지급한 데 이어 2014년 4083억원, 2015년 4373억원으로 매년 190억~385억원씩 늘렸다.
이는 국립대학법인화 이후 부당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기검열만 가동될 뿐, 스스로 국립대가 자정작용을 할 바탕이나 내부적 견제 및 외부적 감시망은 없는 데 따른 사각지대가 생긴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서울대법은 평의회와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등 조직을 예정하고 있다. 재경위원회에 외부인사 1/3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외에는 교직원에 의한 구성과 주도를 예상하고, 이는 특별법의 태도를 서울대법이 답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식 개혁-프랑스식 노력 알맹이 모두 놓친 외형만 수입
그런데 이렇게 외부의 참여폭이 협소하면서 학생들의 의사 개입은 요원하고, 교육당국에서는 과거 운영 시스템 대비 상당한 정도를 반영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만을 짊어진 상태가 융합되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방만한 돈줄 관리로 조성되는 교직원들의 천국'으로만 흘렀다는 것이다.
교수 중심의 학문 연구 조합의 고색창연한 중세적 틀에서 안주해온 독일의 경우도 1998년 대학기본법 개정으로 새 형태를 실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중세 이래의 모델만 고집할 게 아니고 대학 구성원들에 의한 소위 '집단관리대학'의 모델이 기본법(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3항의 학문의 자유 가치결정에 합치(이른바 대학판결)한다고 봤다.
따라서 독일이나 프랑스 등 대학 제도의 고향이자 오래된 영조물 이론에 의한 국립대학 시스템 운영의 경험자들조차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중시하는 변화를 겪어온 점을 교훈으로 얻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런 참여 보장을 통해서만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교육 당국으로부터 받으면서도 그 위엄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국립대학법인화는 외형은 이를 배웠으면서도 막상 그 고갱이를 도입하는 데 놓친 점이 많아 결국 '교원 혹은 직원들이 돈잔치를 즐기는 데 적합한 쪽으로만' 변질되었다는 점이 안타까움을 낳는다.
프랑스식 제도를 모두 세세히 직수입하기가 어렵다손치더라도, 우리 행정법 편제상 특히나 가까운 독일의 변화 흐름을 함께 절충하면 선택의 여지가 넓어진다.
공법상 사단이자 시설물이라는 논리 구성을 아직 거의 대부분 유지해 사용하면서도 변화 시도와 각종 장점 획득을 목표로 삼는 독일 제도를 벤치마킹하기는 어려움이 비교적 적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이번 부정 사례를 계기로 빠른 수술을 단행하거나, 오히려 차라리 과거의 영조물 운영으로 복귀를 선언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