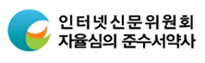[프라임경제] 윤고은 작가의 '요리사의 손톱'이라는 소설에 보면, 식당 소개글을 잘못 쓴 해프닝에서 시작합니다. 'CHEF’S MAIL'을 'NAIL'로 잘못 보면서 벌어진 이야기지요.
그래서 인쇄돼 나온 물량 모두에 스티커를 붙이자느니 수습책에 골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잡지나 책에서 오탈자처럼 곤란한 것도 없습니다. 오류를 잡아내는 교열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까지 필터링되지 못하고 작은 실수가 그대로 나가 버리면, 정말 고민스럽지요. 차라리 크고 많은 오류면 다시 찍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지만 한 글자 같으면 스티커를 붙이거나 하는 궁상스러운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지금은 종영한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서도 후배 편집자의 실수로 저자 이름인지 아주 중요한 글자를 하나 틀려서 주인공이자 선임 편집장인 김현주가 책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흉한 건 사실입니다. 아래 무슨 글자가 숨어 있는지 떼 보고 싶기도 하구요. 저 소설에서도 스티커 같은 걸 붙이면 무슨 사정인가 싶어 기를 쓰고 떼보고 싶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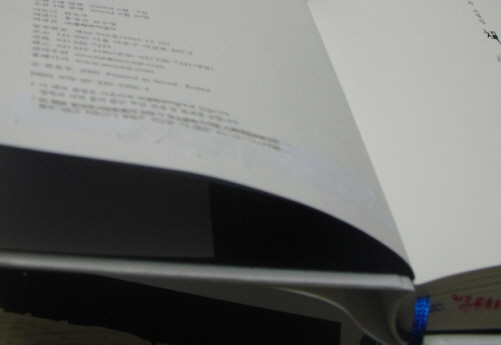 |
||
소설을 한 권 사든 A양. 하지만 A양의 눈에 서지정보 페이지 하단에 붙은 긴 스티커가 눈에 띄었으니…, A양은 호기심을 참지 못 하고 손톱으로 살살 떼어보는데요. 사정을 살펴보니, 저 책은 아마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도서관에 무상으로 기증될 용도로 찍어냈나 봅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에선가 그 물량 이상으로 책이 남았고, 결국 아깝다는 생각에 그 내용을 가려서 대형서점으로 납품하자는 결론을 낸 것이겠지요.
 |
||
분개한 A양. A양으로서는 정가를 다 주고 산 책인데, 원래 공짜로 뿌릴 책이었다는 게 좋을 리 없겠지요. A양은 저 출판사에서 나오는 소설 당분간 안 산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저런 경우라면 서지정보 페이지에 당당히 '인쇄'를 할 게 아니었던 거지요. 물량이 딱 맞았으면 모를까 결국 저렇게 남아서 궁색하게 다시 판매용으로 돌릴 거였으면서, 오히려 저런 내용을 스티커로 붙이는 게 오히려 적당했을 겁니다. "원래 파는 게 당연히 맞지만, 이 스티커가 붙은 책은 기증용이오"라는 듯 말입니다.
한 권에 1만원 남짓하는 책을 가지고도 사람이 저렇게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건데, 더 큰 돈이 걸려 있다면 어떨까 A양은 생각해 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스티커처럼 딱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상황은 의외로 많이 발견됩니다. 세금 문제에서 이런 흔적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원래 세법은 어떤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투영된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특성이 강한 영역이라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끼워넣고 빼고 하는 부분 손질이 용이하고, 그래서 전면적인 개정이나 폐지, 새 법의 마련보다는 일부 수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때그때 고치다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폭탄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 나온 게 눈에 보이거나, 어느 날 순식간에 세목이 사라져 버리거나 대폭 세율이 하락하거나 하는 등 스티커처럼 거슬려 보이는 거지요.
사람마다도 바라보는 관점은 물론 다를 겁니다. 누군가에겐 '최근 당국이 종부세 손질을 하다가 결국 어중간하게 마무리한 것'이 불만스럽고 거슬려 보여 수정 스티커를 긁어서 떼고 싶을 거고, 반대되는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번 정권 초기에 부자 감세를 한 게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거기에 스티커를 발라 버리고 싶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세금 문제를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일을 손쉽게 스티커 붙이듯 고치면 된다고 생각할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책도 스티커를 붙이고 다시 손톱으로 긁어보고 하면서 상처가 나게 마련인데요, 하물며 국가 시스템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요.
애초 정치적으로 즉흥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 게 아니고 충분히 공감대를 얻고 도입하고 빼고 수정하고 해서 나중에 스티커 붙일 필요가 없는 세금, 천년을 가도 손 볼 필요가 없는 세제 시스템이라는 위엄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