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흑산, 黒山, 여차하면 묵산으로 읽을 판이다. 때론 감히 어떤 책에 대한 서평을 써도 되는지 겁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못쓰고 있는 책도 몇 권 있다. 흑산도 그렇다. [칼의 노래]에서만 저자의 예리한 칼날에 수십 번 몸을 피해야 했다. 저자의 표지사진도 춤추는 칼만큼이나 무섭다. 그래도 어느 독자든 책을 사서 읽고, 말할 권리는 있다. 13,800원에 책을 구입했으므로 대충 13,800원 아치 이 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어쨌든 필자에게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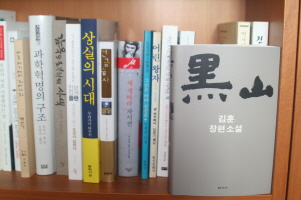 |
||
책을 읽기 전에 이미 알려진 책 소개만으로 소설 흑산의 주된 이야기는 천주교 박해 때문에 흑산도로 유배를 갔던, 다산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 자산어보(玆山魚譜)라는 책을 쓰게 되는 과정과 흑산도 어장의 사시사철이겠구나 미루어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흑산의 줄거리는 전제군주와 양반의 천국인 ‘조선’의 통치철학을 뿌리부터 뒤흔들, 십자가에 걸려있는 ‘야소’라는 서양 남자를 박해하는, 18세기 조선의 새벽을 훑는 써치 라이트였다.
흑(黒)은 어둠 자체이다. 암흑천지의 흑이다. 무섭고, 희망도 없고, 음모가 꽉 차있다. 자(玆)는 원래는 검지 않은 것이 가려져 검게 보이는 것이다. 희미하나 빛이 있고, 있는 곳을 벗어나면 빛을 만날 수 있다.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약전은 흑(黒)이 아닌 자(玆)를 택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시간 싸움일 뿐 언젠가는 빛의 여명이 올 거라는 신앙적 숙원, 서울 양반들의 공자왈 맹자왈이 아닌 실용의 탐구로 조선 이후의 한반도에 자신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훈은 소설에서 정약전의 신앙심이나 배교 후 살아남아 유배지에 갇힌 속마음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소설은 몇 명의 사람들과 그 외 다수의 ‘물건 혹은 그것들’로 구성돼 나간다. 조선은 소수 양반을 위한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다. 천주교로 인해 유배되는 정약전, 매 맞아 죽거나 능지처참을 당한 정약종과 매제 황사영, 그들을 박해하는 삼정승과 대자대비마마 등 지배층 사람들의 야소에 대한 입장. 그리고 남자의 성쇠에 따라 순식간에 사람에서 이것으로 전락하는 여자, 노비, 말먹이꾼, 옹기쟁이, 젓갈장수, 주모 등 이놈, 저놈, 이것, 저것으로 불리고 거래됐던 ‘것’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계기와 순교의 거룩함이 줄거리다.
저자는 특히 실명의 사람 몇으로부터 이름만 빌렸을 뿐 어느 것도 온전한 사실이 아닌 그저 소설일 뿐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사실의 역사와 소설의 이야기를 혼동하지 말기를 주문한다. 아마 전국을 도가니처럼 끓게 했던 공지영의 ‘도가니’를 의식한 발언이 아닐까 싶다. 사실은 기자와 경찰, 검사가 다툴 일이고, 소설은 그저 소설로 쓰이고, 읽혀야 한다는 고집이다.
순매가 참 가엾다. 열 여덟에 결혼했으나 곧바로 흑산도 바다에 빠져 죽는 남편. 한 줌 내장과 한 뼘 지느러미로 새끼 낳아 원양을 헤치는 물고기들의 짓거리에 ‘어매, 이 작은 것으로… …’ 하며 눈물겨워 하는, 유배 양반의 뒷손, 흑산에서 빛나는 순백의 여인 순매가 애처롭다.
황사영이 결국은 잡혔겠지만, 마노리가 북경의 구베아 주교로부터 받아 허리춤에 꼭꼭 숨겨왔던 중국 은화, 조선 돈도 아닌 중국 돈, 인생역전의 요긴한 목돈, 아무리 물정 모르는 그였다 해도 설마 매춘의 대가로 의주 기생에게 그 은화를 주었을까 싶지만, 그렇게 한 것이 헛된 야소 무리의 거목을 체포하는 실마리가 되는 것은 소설일 뿐이라고 해도 좀 아쉽다. 마치 주인공이 예정에 없던 교통사고나 유학으로 사라져 버리는 연속극처럼.
짧고, 간결하고, 명쾌하고, 박력에 찬, 대 소설가 김훈의 문장이야 감히 뭐라 말하기 민망하다. 직접 읽어 보시라. 필자 역시 숨도 밥도 없이 하루 만에 독파했다. 능지처참을 당한 남편을 뒤로 하고 제주도 관노로 끌려가는 젊은 새댁, 두 살 난 아들 황경한을 살리기 위해 추자도 언덕배기에 내려놓고 떠나는 약전의 조카 정명련에 대한 한 줄이 아프게 눈에 박혔다. 이들의 해피 앤딩을 더 들어볼 수는 없을까. 하다못해 서울의 밤을 밝히는 수많은 십자가에서라도.
 |
||
프라임경제 칼럼리스트